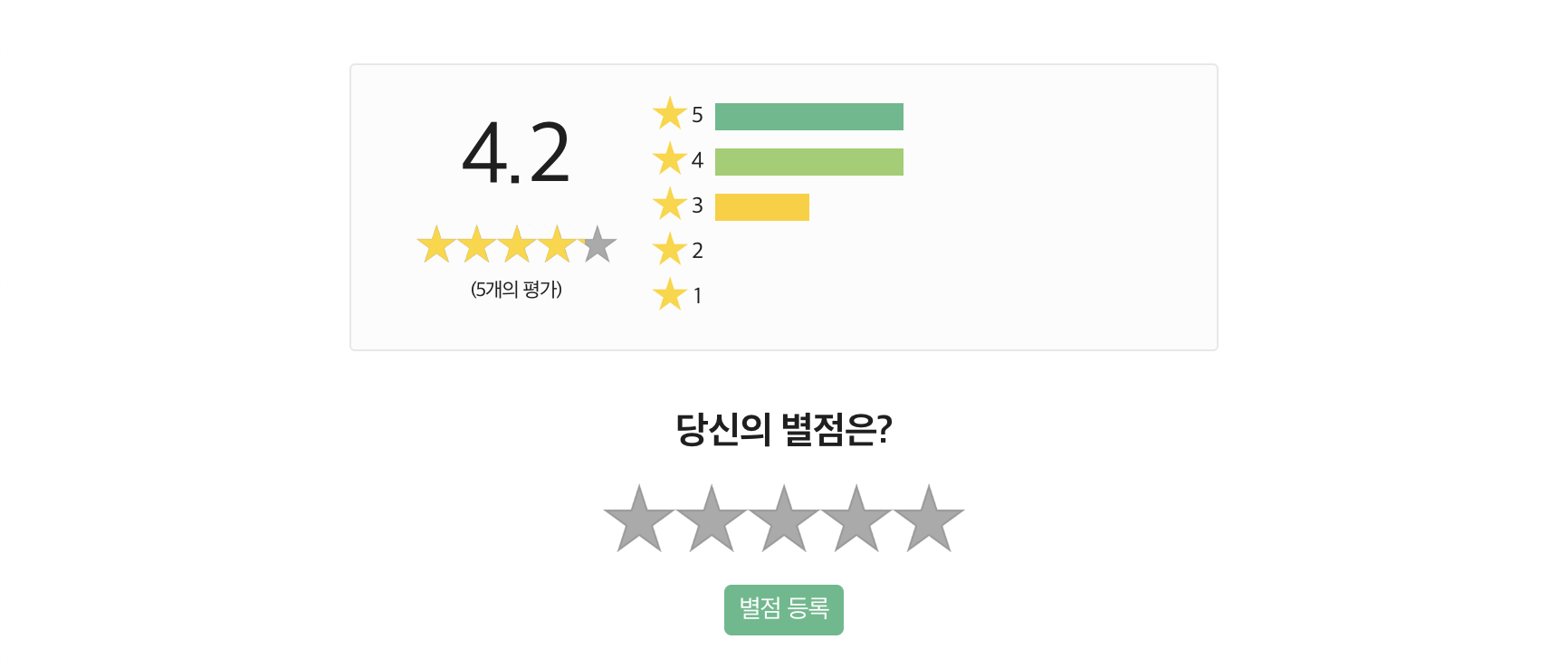대개 궁하다. 궁상 맞게 또 컵라면이냐고 물어도 어쩔 수 없다. 8,000원 짜리 정식이 먹기 싫다고 저 멀리 있는 일식당에 가자는 직장 동료 말에 돈이 없어서,라고 대답하는 게 부끄럽지만 별 수 없다. 벌고 또 벌지만 모을 새도 없이 잔액부족. 부모님 집에 얹혀 사는 지금이야 좀 낫다. 적어도 월세나 생활비는 나가지 않는다. 집에만 붙어 있는다면 굶을 일은 없다. 공과금이 미납되었다고 전기가 끊길 수 있다는 독촉장은 날아 오지 않아서 다행이다.
월급이 들어왔다. 이중 대부분은 지난달 교통비, 신용 카드 비용, 얼마는 큰맘 먹고 할부로 샀던 물건, 또 얼마는 빌렸던 돈을 갚는 데 쓰일 것 같다. 그러고 나면 또 당분간은 빈털터리다. 어머니가 물었다. “혹시 월급 들어올 때 안 됐니.” 어떻게 귀신같이 아셨는지. 치킨이라도 사란다. 알겠다고 했다. 옷을 챙겨 입고 동네 치킨 집으로 향했다.
테이크 아웃은 천 원 할인인 곳이다. 배달보다 직접 사가는 게 싸다. 배달비를 생각하면 2,500원은 이득이다. 네 가족 다 먹을 걸 생각하면 웬만한 크기는 안 된다. “저기 2번 세트랑요, 혹시 콜라 큰 걸로 바꾸면 얼마인가요?” 20분 정도를 멍하니 앉아 조리와 포장을 기다렸다. <썰전>을 잠시 보다가 <백종원의 푸드트럭>으로 눈을 돌렸다. 백종원이 맛이 없는 푸드트럭의 문제점을 신랄하게 꼬집고 있을 때쯤
“포장 다 됐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여주었다. 저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의 심정을 모르는 게 아니니까. 내 작은 웃음이 그를 좀 덜 고단하게 할 수 있다면. 포장된 치킨을 들고 가게를 나섰다. 비가 한 두 방울 떨어지고 있었다. 아이고, 이러다 기껏 산 치킨 다 젖겠네. 우산은 들고 나오지 않았지만 굳이 뛰지는 않았다.
집에 도착해서 치킨을 먹기 시작했다. “2만원? 그렇게 비싸니? 치킨 값이 오르긴 올랐네.” “그래도 맛은 있네.” 뭐 그런 실없는 대화가 오가고, 나는 헤헤 하고 웃는다. 그래도 넷이 먹기는 좀 부족한 양이다. 배가 부르지는 않았지만 자리에서 일어났다. 적당히 먹는 게 중요하다. 방으로 돌아와 컴퓨터 앞에 앉아 키보드를 잠시 두드렸다. 딱히 쓸 이야기가 생각 나지는 않는다.
두 시간, 세 시간쯤 지났을까. 목이 말라 자리에서 일어났다. 주방 식탁에는 아까 큰 사이즈로 바꿔 산 콜라가 사 분의 일쯤 남아 있었다. 어머니는 이 콜라를 아마 변기 청소할 때 쓰려 하실 것이다. 미지근한 펩시콜라. 김이 빠진 채 미지근한 단 맛이 목구멍으로 쏟아진다. 그 맛, 그 맛. 익숙한 맛이다.
불현듯 생각나는 어떤 장면. 오후 두 시쯤, 빛이 거의 들어오지 않는 캄캄한 반지하방, 큼큼한 냄새, 주말인데도 밀린 일을 하느라 새벽에나 잠들었던 어느 날. 쌀이 다 떨어져 시켰던, 냉장고에 넣어둬 눅눅해진 피자 한 조각과 함께 마셨던 콜라와 똑같은 그 맛.
그 맛은, 가난의 맛이다. 돈이 너무 없었던 날, 월급을 받았지만 몇 달 밀린 월세와 공과금, 카드값으로 다 나가버린 그날, 쓸 수 있는 돈이 5만원 정도 남아서 탕진이라도 해버리자 싶어서 시켰던 치킨에 딸려왔던 콜라가 생각나는 맛. 쓸 수 있는 돈이 없어서 편의점 기프티콘으로 샀던 도시락에 딸려 있던 콜라 한 캔이 생각나는 맛, 출근을 했다 집에 두고 온 물건이 있어서 법인카드로 사는 밥을 먹을 수 없었던 날, 반쯤 남은 생라면을 부숴 먹으며 마셨던, 생수통에 담겨 있던 김 빠진 사이다가 생각나는 맛.
그 맛은 가난의 맛이다. 나는 김 빠진 펩시콜라에서 가난을 느낀다. 곰팡이의 냄새를 느낀다. 햇빛이 비추지 않았던 그 방, 환풍이 되지 않았던 반지하방을 느낀다. 수도세를 독촉하던 문자를 느낀다. 후불교통카드가 정지됐다는 문자를 느낀다. 그 맛은 여실히 슬프다.
이 글은 2017년 8월 editorelee.com에 작성했던 글을 재구성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