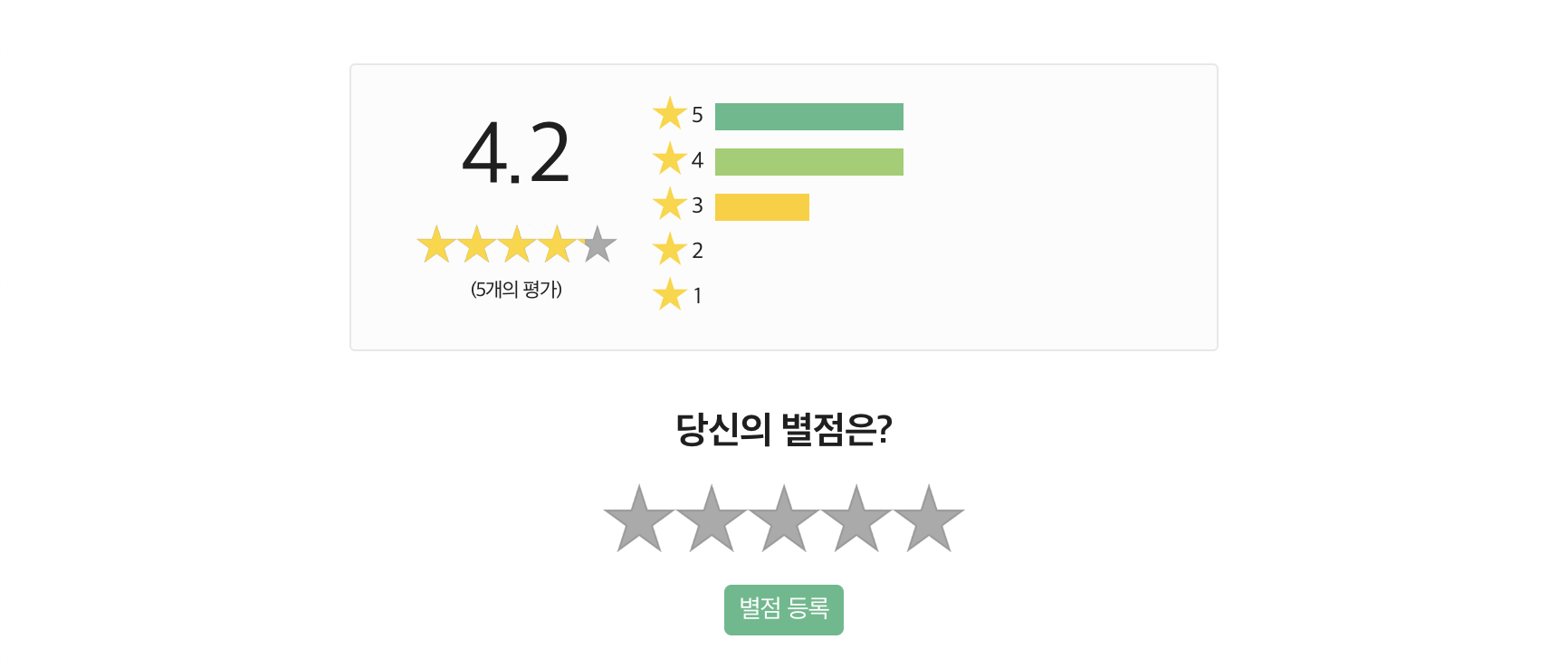다들 인터넷 시대의 저널리즘에 대해서 많이들 이야기하고, 온라인 콘텐츠의 생산과 유통에 대해서도 한 마디씩 거들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로서는 대강을 정리한 지 약간 되었다. 이게 결국 뭐냐는 건데, 피드(feed)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일이라는 생각이다.
이 세상을 하루 더 살아갈 수 있는 최소 열량
그리스도께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가르치신 이래, 일용할 양식(“our daily bread”)이라는 개념은 꽤 다양하게 그러나 다소 피상적으로 인용되고 해석돼 왔다. 하지만 여기서는 좀 다른 부분에 주목해 보려고 한다. 그 양식은 하필 일용할(daily) 양식으로 기술되었는데, 그 뜻은 무엇인가?
원문 그리고 1세기 극동아시아라는 시대적 맥락에 비추어 보자면, daily bread란 이를테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추구하고 살지 않겠으니, 그저 배 곯지 않게만 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의 ‘매 끼니’를 의미하는 것이다. 산해진미나 엄청난 열량이 아니다. 소박하고 서민적인 일과로서, 하루 살아갈 힘을 얻을 필수 영양을 섭취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미이다.
온라인 세상도 세상이고 디지털 시대도 시대인지라, 그 시대를 사는 사람들에게도 그 세상의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리라고 볼 수 있다. 특별히 맛이나 재미가 각별하다거나 항상 새롭다거나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걸 섭취하고 나면 그 세상을 어느 정도 긍정할 수 있고 다시 거기로 뛰어들 수 있게 해 주는 그런 것 말이다. 이에 대응되는 인터넷 개념이 존재한다. 그게 바로 피드(feed)다.
디지털 세계의 주민도 뭔가를 일용(해야 )한다
주기적으로 갱신되는 콘텐츠 목록에 대하여 ‘사료’, ‘매일 먹이는 밥’이라는 의미의 단어 “feed”를 붙일 생각을 누가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의 직관력만큼은 인정받아야 할 것이다. 매일, 혹은 매주 몇 번씩 새로운 내용의 뭔가가 추가 제공된다는 약속이 있을 때, 온라인 세계의 영혼들은 그 약속에 꽤나 관대한 소망을 두어 준다. 구독을 누르고, 필요하면 돈을 결제하고, 군말없이 기다리는 것이다.
왜냐하면, 인터넷이라는 세상은 기본적으로 1세기 극동아시아와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텅 빈 어두운 세상이 막막하게 펼쳐져 있고, 그래서 군데군데 몇 개의 군락에 사람들이 꾸역꾸역 모여서 서로 의지하거나 서로를 착취하며 어떻게든 이 광야에서의 생존을 이어간다. 그렇기에, 그들은 항상 기본적으로, ‘오늘은 어딜 가서 무얼 먹어야 이 하루에 필요한 디지털 만족을 얻을 것인가’를 원초적으로 걱정하고 있다.
사람들이 웹사이트와 팟캐스트와 애플리케이션을 찾아다니고 거기서 뭔가를 매일 약간씩 소비하는 것은, 본질적으로는, 그게 항상 업데이트되는 무엇이기 때문이다. 비록 그 행위 자체는 굉장히 소모적이고 피동적이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다. 한때 단순 통신 수단이었던 인터넷이 이제는 사회적 공간 그리고 (어떤 사람들의) 목적이 되어 버렸으므로, 거기를 살아가려는 대다수 사람들도 뭔가를 매일 소비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해졌다.
사람들은 “뉴스”와 “콘텐츠”를 ‘일용’한다
언론계나 콘텐츠 업계가 디지털 시대의 온라인 저널리즘 또는 콘텐츠 전략의 갈피를 못 잡고 방황하고 있는 광경을, 솔직히 말하면, 대충 몇 년째 보고 있는 것 같다. 아직도 종이 신문의 유효성에 대해 논하는 저명한 저널리스트부터 누가 말했는지도 모르는 말들을 뇌까리는 기획자들까지, 심지어는 대학 다니며 지역 기반 간행물을 만드는 주체들끼리도 너네는 뭐입네 우리는 누구입네 입방아 찧기 바쁘다. 새삼 참 한가로운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들고…
아무튼, 내게는 그런 일련의 “논의”와 “담론”들이 한가로우면서도 좀 미련하게 들리는 것이, 사람들이 뉴스와 콘텐츠를 긍정하고 구독하고 소비하고 대가 지불을 하는 일련의 과정이 전통적인 개념에서 벗어난 지 좀 되었기 때문이다. (그렇다. 이것도 몇 년 된 경향이다.) 그러면 이제 어떤 차원에서 사람들이 뉴스와 콘텐츠를 소비하느냐? 여기까지 읽어 주신 여러분이 짐작하는 대로다. 사람들은 그걸 ‘뉴스피드’라는 이름의 기나긴 ‘타임라인’ 안에서 접한다.
원래 뉴스는 돈을 내고 구독하는 것이었고, 콘텐츠는 도서관에서 빌려 보거나 매장에 가서 사는 것이었고, 친구의 소식은 전화나 편지로 직접 물어보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이 모두가 내가 누른 ‘팔로우’ 버튼 덕분에 나의 뉴스피드에 매일같이 내려온다. 그리고 그 중 오늘 일용할 만한 것이 보이면 우리는 선택적으로 그것들을 소비한다. 그러면 여기서 내가 정확히 뭘 소비하느냐 하는 문제는 거의 안 중요해진다. 뭔진 몰라도 내가 ‘팔로우’를 눌렀을 거거든.
그리하여, 이제 친구의 결혼식 사진과 뉴욕타임즈 기사와 “와썹맨” 영상은 바로 그런 의미에서(만) 동등하다. 디지털 세상이 너무 넓고도 복잡해서 우리는 무엇에 관심을 가져야 할지 모르겠으므로, 뭐든 이에 일용할 만하면 일용하고, 딱히 차별은 두지 않는다. 사람들은 콘텐츠/뉴스를 이렇게 소비하고 있는데, 아직도 사람들이 도서관이나 서점에 가서 책과 영화를 구(해야 )한다고 믿는 콘텐츠/뉴스 업계 사람들만 이걸 깨닫지 못한다.
당신이 공급하는 그것이 피드임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온라인 세상이 되면서 뉴스 업계가 너무 힘들어졌다느니, 콘텐츠 하나 하기가 너무 어렵다느니, 잡지며 독립언론 등의 나아갈 방향이 보이지 않는다느니 하는 얘기들이 많다. 나는 이 의견들을 부정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긍정해 주기도 어렵다는 생각이다. 왜냐면, 당장 내가 평소에 뭘 하고 있느냐면, 사용하는 모든 SNS를 1시간에 한 번씩 순회를 돌다시피 하며 새로고침을 당기다가, 뭔가가 올라오면 그걸 마지막 1픽셀까지 꼼꼼이 훑어먹고 있기 때문이다.
‘비트코인 갤러리’가 한창 흥하던 작년 이맘때는 거기가 나의 일용할 피드였다. “떡상”과 “떡락”을 외치는 글들의 ‘리젠율’이 미쳐 있었던 탓이다. 그렇다. 사람들은, 나도 그렇지만, 적어도 디지털 세상에서는, 뭔가 새로운 내용이 꾸준히 ‘리젠’되면, 그리고 그게 무슨 금기라거나 기피될 만한 것이 아닌 이상은 얼마든지 사먹어 줄 용의가 있다. 디지털 세상에서 새로운 정보란 우리가 그토록 염려하며 굶주려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만약 당신이 콘텐츠를 사람들에게 팔고자 한다면, 바로 이 점을 이해해야 한다. 사람들이 그날그날 보거나 들을 수 있는, 나아가서 활용하거나 공유도 할 만한 뭔가를 꾸준히 사람들에게 공급해, 그것이 그들의 일용할 양식이 되도록 하는 것이 당신의 작업의 본질이어야 한다. 사람들은 그런 걸 찾아다니고 있기 때문이다.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그저 매일 올라올 뿐인 쓰레기 같은 뭔가가 당신을 훌쩍 이겨먹는 현상을, 당신은 영영 이해할 수 없게 된다.
그리고 물론 이런 공급자로서의 인생을 살 생각이 없다면 이건 모두 당신과 관계 없는 이야기다. 오히려 만약 그리스도시라면 이 광야 같은 인터넷 세상을 사는 우리에게는 그런 것에 마음 쏟지 말라고 가르치실 것 같다는 생각이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시청할까 무엇을 검색할까 내 인터넷 생활을 위하여 무엇을 구독할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 천부께서는 오늘날 너희가 이 모든 것을 알아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